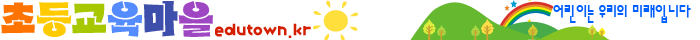유연하게 사는 것이 타협과 동의어는 아니며
확신을 갖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삶의 품격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하나는 ‘생명력’이다. 생명력 있는 글이 좋은 글이고, 생명력 있는 삶이 좋은 삶이다. 생명력이 있는 글이란 불필요한 부사(副詞)가 많이 쓰이지 않은 글이다. 미국의 작가 스티븐 킹은 좋은 글의 조건을 설명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adverbs)라고 표현하며 불필요한 부사의 남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불필요한 수식어는 작가가 자신의 주장에 자신이 없을 때 남발하게 된다. 부사를 내세워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좋은 삶도 그렇다. 불필요한 부사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인생은 생명력이 없다. 필요 이상의 권력, 부, 명품, 경력, 이미지 등이 그런 인생의 부사들이다. 글에서 부사를 한 번 남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부사의 수가 늘어나듯이, 인생의 부사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수가 늘어난다. 결국 생명력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는 그저 그런 글과 그저 그런 삶이 되고 만다.
좋은 글과 좋은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톤’(tone)이다. 지나치게 강한 어조의 글은 독자들의 자유를 침해한다. 독자들의 상상력도 제한한다. 때로 그런 단정적인 글은 글쓴이의 지적 오만이나 지적 무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학자들의 글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을 때, 단 한 번에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때로는 연구 방법론의 한계 때문에, 때로는 분석의 문제점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지만, 글쓰기의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4/11/a2866fd8-2db7-4969-b8d8-b50ee00d4df3.jpg)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좋은 삶도 그렇다. 아무리 자기 확신이 강하더라도 지나치게 단정적인 어조로 삶을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 자유의 침해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확신에 찬 주장이라 할지라도, 더 나은 주장이 존재할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인 경우에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의식의 편협함을 드러낼 뿐이다.
유연한 삶이 곧 타협하는 삶은 아니다. 삶의 복잡성에 대한 겸허한 인식이고, 생각의 다양성에 대한 쿨한 인정이며, 자신의 한계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이다. 확신을 갖되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격이 있는 삶이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확신으로 타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상대의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문재의 시 ‘농담’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 돌아보게 한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토록 멋진 시의 제목이 왜 ‘농담’일까? 가벼운 유머라는 뜻의 농담(弄談)일까, 아니면 깊이 있는 말이라는 뜻의 농담(濃談)일까? 시인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벼운 농담이라고 이해하면 삶의 어조를 낮추고 지나치게 심각하게 살지 않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사랑에 대하여, 외로운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놓고는, 자신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고 톤을 낮추는 듯하다.
물질과 권력과 이미지를 향한 욕망이 득실거리는 이 물질주의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한 이 자기표현의 시대에, 인생의 부사를 줄이고 삶의 어조를 낮추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글 또한 농담처럼 받아들여지면 좋으련만.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