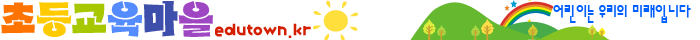자녀와 제자의 모습은 부모와 스승이 살아온 삶의 반영
그 닮음은 뿌듯한 보람일 수 있지만 미안한 후회일 수도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
내일로 다가온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자 직업을 살펴보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같은 말은 이미 화석화돼 버린 시대에서 중·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대학은 취업용 스펙을 쌓는 통과 과정이 돼 버린지도 모른다. 과장해 표현하자면 수업료를 내고 적절한 노력을 투입구에 넣으면 졸업장이 자동으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돼 버린 시대, 성과와 업적 때문에 교육의 인격적 접촉은 점차 희미해져 가는 쓸쓸한 시대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대를 탓하기에 앞서 과연 내가 교육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한없이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특히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더욱 그러하다. 우리 윗세대의 스승님들이 보여 주셨던 인격적인 가르침을 우리 시대의 교육자는 하고 있는가?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먼 젊고 부족한 교수에 불과하지만 ‘언젠가 스승이 되고 싶은 선생’이라고 프로필에 썼던 적이 있다. 직업적인 명칭으로서의 교수와 삶의 지표가 되는 스승은 다른 뜻일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합격하고 등록한 지위로서의 학생과 공자의 표현처럼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가르침을 얻는 제자의 차이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수·스승과 학생·제자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조합이 있다. 교수와 학생의 건조한 직업적 관계 혹은 스승과 학생, 교수와 제자의 일방향적 관계와 달리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드는 인격적 만남이 있을 것이다. 학문과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순자(荀子)의 청출어람(靑出於藍)을 꿈꾸는, 서로가 존중하고 존중받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그려 본다.
스승의 날 반성이 길어져 버렸지만 교육자보다 훨씬 더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직업은 바로 ‘부모’가 아닐까. 경제적 보상을 얻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업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나 사회적 유용성과 책임성이라는 점에서 직업이라 불러도 가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저절로 주어진 역할인 듯 착각하기도 하지만 자유 의지에 의한 선택인 동시에 소명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불안한 일이며 처음부터 훈련받은 부모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성공적인 장년이 성취해야 할 이슈로 ‘생산성’을 제시했다. 이때의 생산성이란 일의 성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돌보고 양육하는 중요한 과제를 포함한다.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교육자와 부모가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말과 지시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이 투영되는 것이며 모델링을 통해 가감 없이 투명하게 전해진다. 앨버트 반두라가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설명했듯이 인간행동발달은 관찰을 통해 이뤄지며 일상에서 노출되는 부모와 스승의 모습은 스펀지처럼 흡수된다.
‘365일 24시간 직업’이라는 표현은 긴장 속에서 완벽하고 그럴듯한 모습을 항상 연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하고 싶다. 오히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문제에 고민하는 모습, 고난을 견디는 모습, 좌절을 극복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진솔함, 그리하여 삶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양육과 교육의 과정일 것이다.
이 직업군의 특징이라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누구를 ‘닮는다’는 단어처럼 감동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양가감정의 단어가 어디 있으랴. 자신의 삶이 반영된 자녀와 제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삶의 선명한 결과로 남는다. 그 닮음이 뿌듯한 보람일지, 아니면 마주 보기 미안한 후회일지를 직면해야 하는 그런 ‘365일 24시간 직업’이기에.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