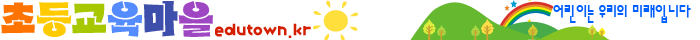주철환 아주대 교수·문화콘텐츠학
성우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우리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따뜻해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방법은 따뜻하지 않았다. 화면 속 아이는 혼자 우는데 촌지를 주고받는 교사와 학부모는 크게 웃는다. 카메라에 현장이 잡히고는 화들짝 놀란다. 놀라는 배우의 표정이 누군가를 놀리는 듯하다. 어색한 상황이 복도·교실·주차장 등 장소를 달리하며 반복된다.
영상을 본 교사들 반응은 어땠을까. 대부분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기자는 전한다. 부끄러워서? 교사들은 뭐가 부끄러웠을까? “아직도 동료 교사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니….” 그것보다는 “이런 모욕감을 느끼려고 내가 교직을 택했던가?” 이 점이 더 아프지 않았을까? 교사 출신인 내가 봐도 반성보다는 반발의 감정이 앞섰을 것 같다. 교사의 자존감을 꼭 저런 식으로 짓뭉개야 했나? 교사의 사(師)는 박사의 사(士)나 판검사의 사(事)와는 다르다.
촌지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다. 자식을 맡아 키워주는 선생님께 조그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뭐가 나쁜가? 많이 나쁘다. 봉투 속에 감사가 아니라 청탁이 담겼기에 나쁘다. 공평하지 않아서 나쁘다. “내 아이를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내 아이만 특별히 잘 봐주세요”이기에 나쁘다.
촌지가 아름다우려면 시간이 흘러야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국어선생님(고3 때는 담임까지 맡으셨다)을 나는 평생 가슴에 안고 산다. 스승의 날마다 ‘촌지를 들고’ 찾아뵙는다. 재학 중엔 촌지를 드릴 형편이 못 됐다. 드린다고 받으실 분도 아니었다. 그분을 나는 로댕에 비유한 적이 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구리와 주석에 불과했다. 그분의 숨결과 손길이 닿아서 나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 고맙기 그지없는 분이다. 그분께 드리는 촌지는 그야말로 은혜의 정표다.
당신을 만든 로댕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올 스승의 날엔 은퇴한 은사님을 찾아 촌지를 드리자. 누가 막겠는가. 그런 걸 찍은 촌지 동영상이 있다면 진짜로 세상이 따뜻해질 것이다.
주철환 아주대 교수?문화콘텐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