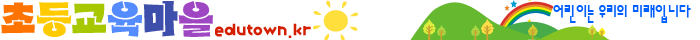인구 문제는 언제나 지도자들의 관심사였다. 사람이 병력(兵力)이자 노동력이던 시절엔 더욱 그랬다. 1919년 10월 11일 프랑스 상원. 제1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베르사유 조약 비준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원들 앞에서 조르주 클레망소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프랑스가 출산에 등을 돌린다면 독일의 모든 무기를 빼앗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지라도 패배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프랑스인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 인구는 3900만 명, 독일은 6500만 명이었다(현재는 프랑스 6600만 명, 독일 8000만 명).
 을미년 새해 첫날 0시0분에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 2013년 한 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43만6600명이었다. [뉴시스]
을미년 새해 첫날 0시0분에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 2013년 한 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43만6600명이었다. [뉴시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마이클 타이털바움(71) 박사는 공저 『인구 감소의 공포 』(1985)에서 “프랑스 인구성장이 독일에 못 미친다는 열등감이 프랑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인구는 국가 안보와 경제, 민족 구성과 종교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율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인구 문제는 국가 어젠다가 된다”고 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이 일면서 식량난과 빈곤, 환경 파괴가 우선적인 걱정거리였지 저출산 고민은 쑥 들어갔다. 그러다 80~90년대 이후 출산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세계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때론 공포가 조장되기도 한다. ‘2700년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2009년 유엔미래보고서)거나 ‘2200년 한국 인구가 2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2014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예측이 그 사례다. 그렇다면 저출산 등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과장된 것일까.
최근 방한한 타이털바움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정책은 과장된 경고, 암울한 예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출산은 암울한 것, 맞지 않나.
- 저출산은 암울한 것, 맞지 않나.
“출산율 감소는 인류 번영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증대됐다. 여성도 배울 수 있게 됐고 경제활동 참여도 늘었다. 부모의 역량을 소수의 자녀에게 쏟아부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 인재를 양성했다. 국가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 저출산 경보음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대재앙이 닥칠 것처럼 과장하는 일은 인구 분야에서는 종종 일어난다. 이런 패닉과 공포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백 년 후에도 모든 조건이 현재와 같다는 전제의 예측인데 과학 발전 등 우리 삶이 지금과 같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인구 변화는 속도가 완만하다.”
- 한국 출산율 1.19명도 괜찮다는 건가.
“아니다. 낮아도 너무 낮다. 오랜 기간 1.0~1.2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심각하다.”
- 출산율 하락의 근본 이유는 뭔가.
“사는 게 팍팍해져서 아닐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평생 고용이 사라진 시대에 20~35세 젊은 성인들은 가진 자원을 학력과 경력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맞벌이도 해야 한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 출산율 제고 해법은.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학교 교육, 주택, 일자리 정책을 두루 살펴 출산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초등학교는 등교시간이 미국보다 늦고 하교시간은 빠르다고 들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8시~8시30분에 등교해 오후 3~4시쯤 마친다. 한국처럼 오전 8시40분~9시에 등교해 낮 12시30분~1시30분쯤 끝나면 부모, 특히 엄마들은 일을 하기 어렵지 않나.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미국 출산율은 1.88명이다.”

- 그밖에 장애물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높은 집값이 젊은 부부의 결혼과 출산의 발목을 잡는다고 들었다. 젊은 부부들이 주택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로 중년층도 위기를 느끼겠지만 청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타이털바움 박사는 “한국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미국은 8~9세면 오후까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책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재점검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출산율을 높인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과 프랑스를 ‘출산율 우등생’으로 꼽는데 두 나라는 각각 여건에 맞는 출산정책을 폈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육아를 나눌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공공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해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200여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을 놓고 “이렇게 많은 정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실패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올해 끝난다. 제1차 대책 이후 출산율은 1.12명(2006년)에서 1.19명(2013년)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한다.
박현영 기자
“프랑스가 출산에 등을 돌린다면 독일의 모든 무기를 빼앗고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지라도 패배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프랑스인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 인구는 3900만 명, 독일은 6500만 명이었다(현재는 프랑스 6600만 명, 독일 8000만 명).
 을미년 새해 첫날 0시0분에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 2013년 한 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43만6600명이었다. [뉴시스]
을미년 새해 첫날 0시0분에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 2013년 한 해 태어난 아기는 모두 43만6600명이었다. [뉴시스]세계적 인구통계학자 마이클 타이털바움(71) 박사는 공저 『인구 감소의 공포 』(1985)에서 “프랑스 인구성장이 독일에 못 미친다는 열등감이 프랑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인구는 국가 안보와 경제, 민족 구성과 종교에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율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인구 문제는 국가 어젠다가 된다”고 썼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이 일면서 식량난과 빈곤, 환경 파괴가 우선적인 걱정거리였지 저출산 고민은 쑥 들어갔다. 그러다 80~90년대 이후 출산율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세계 곳곳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때론 공포가 조장되기도 한다. ‘2700년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2009년 유엔미래보고서)거나 ‘2200년 한국 인구가 200만 명으로 쪼그라든다’(2014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예측이 그 사례다. 그렇다면 저출산 등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과장된 것일까.
최근 방한한 타이털바움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정책은 과장된 경고, 암울한 예언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감소는 인류 번영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 아이를 적게 낳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증대됐다. 여성도 배울 수 있게 됐고 경제활동 참여도 늘었다. 부모의 역량을 소수의 자녀에게 쏟아부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 인재를 양성했다. 국가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
- 저출산 경보음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대재앙이 닥칠 것처럼 과장하는 일은 인구 분야에서는 종종 일어난다. 이런 패닉과 공포는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문제를 복잡하게 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수백 년 후에도 모든 조건이 현재와 같다는 전제의 예측인데 과학 발전 등 우리 삶이 지금과 같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인구 변화는 속도가 완만하다.”
- 한국 출산율 1.19명도 괜찮다는 건가.
“아니다. 낮아도 너무 낮다. 오랜 기간 1.0~1.2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심각하다.”
- 출산율 하락의 근본 이유는 뭔가.
“사는 게 팍팍해져서 아닐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평생 고용이 사라진 시대에 20~35세 젊은 성인들은 가진 자원을 학력과 경력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맞벌이도 해야 한다.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 출산율 제고 해법은.
“젊은 부부가 자녀를 낳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부터 치워야 한다. 학교 교육, 주택, 일자리 정책을 두루 살펴 출산과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 초등학교는 등교시간이 미국보다 늦고 하교시간은 빠르다고 들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오전 8시~8시30분에 등교해 오후 3~4시쯤 마친다. 한국처럼 오전 8시40분~9시에 등교해 낮 12시30분~1시30분쯤 끝나면 부모, 특히 엄마들은 일을 하기 어렵지 않나.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미국 출산율은 1.88명이다.”

- 그밖에 장애물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높은 집값이 젊은 부부의 결혼과 출산의 발목을 잡는다고 들었다. 젊은 부부들이 주택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춰줘야 한다.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경기 침체로 중년층도 위기를 느끼겠지만 청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타이털바움 박사는 “한국의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짧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미국은 8~9세면 오후까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대응책은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재점검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출산율을 높인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스웨덴과 프랑스를 ‘출산율 우등생’으로 꼽는데 두 나라는 각각 여건에 맞는 출산정책을 폈다. 스웨덴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육아를 나눌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했다. 프랑스는 공공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해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200여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을 놓고 “이렇게 많은 정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며 “실패하기 쉽다”고 평가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올해 끝난다. 제1차 대책 이후 출산율은 1.12명(2006년)에서 1.19명(2013년)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한다.
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