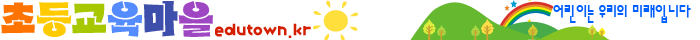백성호 문화스포츠부문 차장
두 발 자전거는 처음입니다. 둘째 아이는 열 살. 그동안 네 발 자전거를 탔습니다. 매사에 조심성이 많은 편입니다. 지난 주말, 양재천으로 갔습니다. 다리 밑 공터에서 아이는 두 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아내와 저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쯤” 예상했습니다. 혼자서 페달을 밟을 때까지 말입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뒤에서 자전거 안장을 잡아줘도 계속 넘어집니다. 페달은 두 바퀴를 넘지 못합니다. 두 발짝 가다가 넘어지고, 세 발짝 가다가 기우뚱합니다. 아내는 속이 탑니다. ‘저러다 무릎이라도 까지면 어떡하나.’ 한참 씨름하다가 아이가 말하더군요. “엄마, 내가 할게!” 페달에 두 발도 못 올리면서 혼자 하겠답니다.
아내와 저. 멀뚱멀뚱 얼굴을 쳐다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벤치에 앉습니다. 아이는 혼자서 낑낑댑니다. 핸들도 꺾어보고, 페달을 손으로도 돌려보고,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이리저리 시도하며 ‘고군분투’합니다. 쿵! 자전거가 넘어져도 그냥 둡니다. 아이는 혼자서 일어나 다시 안장에 앉습니다. 멀리서 쳐다봐도 빤히 보입니다. 나름대로 감을 잡으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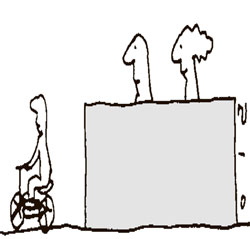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오늘 조금 배운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아이가 혼자 하게끔 맡겨 두고 기다려 주기’라고 합니다. “오늘 뒤에서 계속 잔소리하며 안장을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아이가 혼자 힘으로 자전거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과정은 없지 않았을까. 오히려 자전거를 더 늦게 배우지 않았을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맡겨놓고 기다리는 일 말입니다. 왜냐고요? 불 보듯 뻔하니까요. 자전거가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들 테니까요. 대부분 부모는 그걸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려 합니다. 훌쩍 건너뛰려 합니다. 아이가 치러야 할 고통과 시행착오를 빼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속이 타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어른 눈에는 답이 빤히 보이는데, 아이는 계속 맴돕니다. 부모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다 못해 “답이 여기 있으니, 이 답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큰 착각 아닐까요. 우리 삶에는 ‘네 발 자전거’에서 ‘두 발 자전거’로 옮겨 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나름의 시행착오와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건 아이에게 큰 기회입니다. 왜냐고요? 고통과 시행착오. 아이는 그걸 통해 스스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풀면서 인생을 푸는 법을 배우니까요. 많은 부모가 아이에게서 그런 기회를 앗아갑니다. 아이를 위한다며, 부모의 마음이 아프다며 말입니다.
가만히 짚어보세요. 자전거를 배우다가 넘어지는 아이. 부모는 그걸 ‘아픔의 풍경’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기쁨의 풍경’으로 봐야 할까요. 여기에 달렸습니다. 아이의 시행착오와 나름의 고통. 그걸 ‘아픔’으로만 보는 부모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끼어들고 방해하고 재촉합니다. 결국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아이가 힘겨워하는 시행착오가 성장을 위한 ‘기쁜 풍경’임을 이해하는 부모는 다릅니다. 느긋하게 지켜보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모일까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부모일까요.
백성호 문화스포츠부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