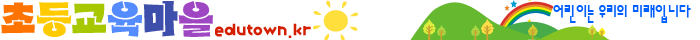좋은 글마당
새끼들 먹이며 사랑 전하는 포유류… 누가 먹여 키웠나 정체성에 큰 영향
무상급식 먹고 자란 아이들, 부모 생각하는 마음 예전
같을까
식중독 무서워 '튀김' 선호한다는데 우리 아이들 성인병은 어쩌나
김석대 신경전신과 전문의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다 먹는다. 어미는 새끼를 먹여 기르고, 새끼는 먹여주는 어미에게서 사랑을 배운다. 그렇게 배운 사랑을 다시 자기 새끼에게 쏟아 베풀면서 어미가 된다.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동물은 물론이고, 젖이 없는 새나 물고기도 먹이를 날라다 새끼를 먹인다. 먹이를 주는 것은 모든 어미의 특권이고, 새끼는 먹여주는 어미에게 감사하며 어미를 사랑하게 된다. 짐승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가장 따른다. 자식을 먹여 기르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자식으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받을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을 누리려면 자식을 직접 먹이고 입혀 키워야 한다.
엄마가 되었다고 그날부터 음식 솜씨가 요술처럼 별안간 좋아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누구나 엄마의 손맛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신기한 것은 내 어머니의 음식 맛과 아내의 음식 맛이 전혀 다른데, 아내의 손맛과 어머니의 손맛이 똑같이 맛있다. 내게는 그 맛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가끔 여행 중에는 전문 요리사들이 요리한 음식들만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내 질리고, 아내가 싸준 고추장이 산해진미를 뺨친다. 음식에는 재료와 양념 이상의 맛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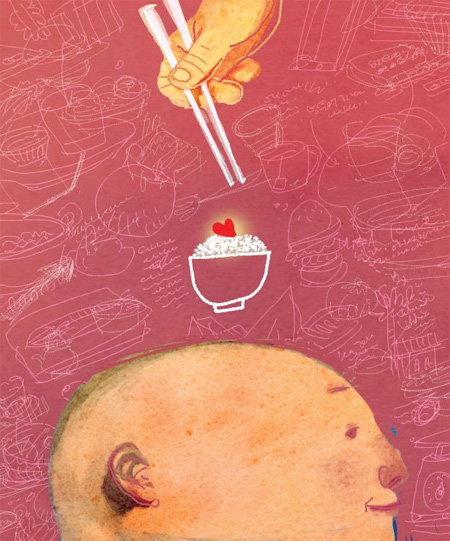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일러스트=이철원 기자
꽤 오랫동안 '무상 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먹이고 길러야 할 아이들을 나라가 차별 없이 똑같이 돈 안 받고 먹여주겠다는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도 나랏돈으로 먹일 필요가 있느냐부터 재정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정치권이 선심성 정책에만 매달렸다는 비판들까지 나온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어쩌다가 나라와 부모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상 급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버리고 나라 편에 서지는 않을까.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물지 않는 법이다.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심심풀이로 골탕먹이는 심술궂은 주인집 아이가 있었다. 어느 날 벼르면서 기회를 노리던 강아지가
아이에게 대들어 물고 할퀴었다. 집안 식구 누구도 잇몸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는 강아지를 말릴 재간이 없다. 이때 부엌에서 일하던 가정부 아주머니의
한마디에 강아지가 조용해진다. 강아지는 주인보다 밥 주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다.
사람이 짐승과 같을 리야 만무하지만, 과거
중국 문화혁명 시절의 '홍위병'을 생각해보면 오싹하다. 나라가 직접 먹이고 입혀 키운 어린 중학생들이 홍위병이 되어 부모를 고발하고 총칼을
겨누지 않았던가. 그 어린 학생들이 꼭 마오쩌둥 사상에 투철해서 그랬을까. 그만큼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누가 자기들을 먹이고 키우고
입혔는지는 중요한 것이다. 먹고 입고 자는(衣食住) 기본적인 일은 본래 가정의 영역에 속한다. 이를 나라에서 다 해주겠다고 하면 그건 결코
고마운 일도 아니다. 이를 현실에서 실현해보려 했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험'도 이미 실패로 끝난지 오래다.
사실 학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아이들 밥을 공짜로 먹여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내 자식 먹이는 일에 누가 돈을 아끼겠는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보리죽이라도 내가 벌어 먹이겠다"는 오기는 가져야 한다. 아이들을 먹이는 책임과 권리는 부모에게 돌려주고, 나라는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세워 모든 가정이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학교도 아이들에게 직접 밥을 먹이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밥 먹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는 정답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요즘 교장선생님들은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집단 식중독 때문에 주말이나 되어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고 한다. 영양학이나 조리학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식중독이
생기면 책임은 몽땅 뒤집어쓰게 생겼으니 말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든 튀겨내는 조리법이라고 한다. 끓는 기름 가마에서 살아남을 세균은
없을 것이고, 튀긴 음식은 아이들이 좋아하니 궁여지책치고는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런데 튀김기름의 트랜스지방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일찌감치 생기는 성인병들은 어이할거나.
조선일보-사외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