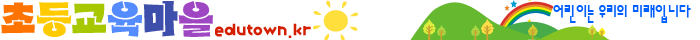좋은 글마당
평범한 선생님은 말을 하고,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하며, 뛰어난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고, 위대한 선생님은 영감을 준다
할렘 고교의 기적 비결은[중앙일보] 입력 2012.06.23 00:00 / 수정 2012.06.23 00:00
뉴욕 할렘에 자리 잡은 데모크라시 프렙 차터스쿨. 학생의 80%가 흑인, 나머지 20%는 히스패닉이다. 열 명 중 8명이 가난한 편부모 밑에서 자랐다. 7년 전 이 학교를 설립한 세스 앤드루 교장은 학생 면담 후 한 번 더 놀랐다. 맨해튼의 유일한 아이비리그(동부 명문 8개 사립대) 컬럼비아대학이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었지만 거기 가본 적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아이비리그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이란 단어조차 아이들에겐 생소했다.
그런데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됐다. 데모크라시 프렙은 지난해 뉴욕주 공립학교 중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 복도 천장엔 컬럼비아뿐 아니라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는 물론이고 연세대 깃발까지 빼곡히 달려 있었다.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이 학교 예비 12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더 이상 꿈같은 동화가 아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했던 교장의 한국식 교육 실험으로 할렘의 기적을 일궈낸 고등학교 이야기다.
학교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리 속을 맴돌았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학생들의 실력? 말할 필요도 없다. 데모크라시 프렙은 ‘자립형 공립학교’다. 학생도 추첨으로 뽑는다. 할렘에서 뽑은 신입생들의 수준? 안 봐도 비디오다.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있지만 한국에도 그 정도 ‘선생님’은 많다. 그런데 한국식 교육의 기적은 왜 할렘에서만 일어난 걸까?
안개 속을 걷듯 답답하던 머리 속이 학교를 나서는 순간 번쩍했다. 학교 담장은 두 길 높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에선 희망이 자라고 있지만 밖엔 절망뿐이다. 진저리처지는 가난, 오금이 저려오는 폭력.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학교요 성적이었다. 앤드루 교장이 할렘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단순히 한국어나 봉산탈춤·태권도가 아니다. ‘나도 대학이란 곳에 갈 수도 있겠다’는 꿈, ‘대학 가면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한국어를 통해 한국이란 먼 나라에서 이뤄낸 성공 신화를 자신의 꿈과 희망으로 체화(體化)한 것이다. 일단 아이들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이 뿌리를 내리자 기적의 나무는 스스로 쑥쑥 자랐다. 어느 틈엔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절실함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피눈물을 쏟으며 벗어나고픈 가난도, 생각만 해도 눈물 나게 하는 고향의 가난한 부모님도 이젠 추억담이 됐다. 그런 아이들에게 꿈은 대학 가서나 꾸고 ‘닥치고 수능 성적부터 올리라’니 글자가 교실 허공을 둥둥 떠다니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 아닐까. 할렘의 아이들에겐 내로라하는 강남 학원도, 족집게 과외선생님도, 엄마의 치맛바람도 없었다. 다만 아이들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이란 씨앗만 뿌려주자 기적은 저절로 싹을 틔웠다. 하기야 기적은 늘 뭐든 환장하도록 염원하는 사람의 전리품 아니던가.
그런데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됐다. 데모크라시 프렙은 지난해 뉴욕주 공립학교 중에서 최고 성적을 냈다. 복도 천장엔 컬럼비아뿐 아니라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는 물론이고 연세대 깃발까지 빼곡히 달려 있었다. 한국의 고3에 해당하는 이 학교 예비 12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은 더 이상 꿈같은 동화가 아니다.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했던 교장의 한국식 교육 실험으로 할렘의 기적을 일궈낸 고등학교 이야기다.
학교를 취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리 속을 맴돌았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학생들의 실력? 말할 필요도 없다. 데모크라시 프렙은 ‘자립형 공립학교’다. 학생도 추첨으로 뽑는다. 할렘에서 뽑은 신입생들의 수준? 안 봐도 비디오다. 열정을 가진 교사들이 있지만 한국에도 그 정도 ‘선생님’은 많다. 그런데 한국식 교육의 기적은 왜 할렘에서만 일어난 걸까?
안개 속을 걷듯 답답하던 머리 속이 학교를 나서는 순간 번쩍했다. 학교 담장은 두 길 높이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에선 희망이 자라고 있지만 밖엔 절망뿐이다. 진저리처지는 가난, 오금이 저려오는 폭력. 이곳에서 탈출하게 해줄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학교요 성적이었다. 앤드루 교장이 할렘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건 단순히 한국어나 봉산탈춤·태권도가 아니다. ‘나도 대학이란 곳에 갈 수도 있겠다’는 꿈, ‘대학 가면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덫에서 해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었다.
한국어를 통해 한국이란 먼 나라에서 이뤄낸 성공 신화를 자신의 꿈과 희망으로 체화(體化)한 것이다. 일단 아이들 가슴 속에 꿈과 희망이 뿌리를 내리자 기적의 나무는 스스로 쑥쑥 자랐다. 어느 틈엔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절실함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피눈물을 쏟으며 벗어나고픈 가난도, 생각만 해도 눈물 나게 하는 고향의 가난한 부모님도 이젠 추억담이 됐다. 그런 아이들에게 꿈은 대학 가서나 꾸고 ‘닥치고 수능 성적부터 올리라’니 글자가 교실 허공을 둥둥 떠다니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