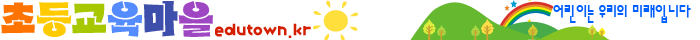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 이상언 런던 특파원
아침 급식이 이뤄지는 한국의 학교를 상상해 봤다.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이 제안한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의 모습이다. 외신들은 이 진풍경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자율학습’을 마치고 어둠 속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을 신기하게 봐온 그들은 “이제는 아예 아침 식사까지 단체로 학교에서 한다. 집에 다녀온다는 표현이 더욱 실감난다”고 소개할 것 같다.
“미국·영국·스웨덴에는 이미 아침 급식이 활성화돼 있다”고 의원들은 주장했다. 살펴보니 ‘활성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이뤄져 왔을 뿐이고, 스웨덴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지만 단체 급식은 아니다.
초등학교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침 급식이 가장 일반화된 곳은 영국 웨일스 지방이다. 2003년 지방의회 선거 때 노동당 공약으로 채택돼 이듬해 시작됐다. 당초 계획은 2년 안에 1600여 개의 웨일스 지역 전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교의 반대, 식사 준비와 배식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어 아직도 1000개가량의 학교에만 도입됐다.
급식 실시 뒤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여러 편 나왔다.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분명히 낮아졌다. 과일 섭취 등으로 학생들의 영양 상태도 다소 좋아졌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 태도 개선이나 학업 성적 향상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그치지 않는다. 교사 단체도 “차라리 그 돈으로 수업에 뒤처지는 학생을 별도로 지도할 교사를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아침을 거르는 초·중·고 학생이 37%다. 그중에는 가난하거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못 먹는’ 학생도 꽤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1분이라도 더 자려고 이불 속에서 버티다 허둥지둥 뛰어나가는 학생일 것이다. 의원들은 아침 급식이 “국가 교육경쟁력 차원에서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밥 먹여서 공부 더 잘하게 하자”는 말처럼 들린다.
학원 때문에, 부모의 늦은 귀가 때문에 한국에선 그나마 아침이 가족이 마주할 수 있는 때다. 그 시간마저 ‘경쟁력’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무리 급조된 공약이라지만 어설프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