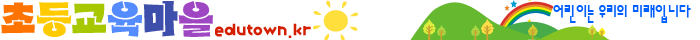생활기록부에 ‘온순’이란 글자가 빠지지 않던 나에게도 폭력으로 얼룩진(?) 시절이 있었다. 청년문화와 군사문화가 동거하던 1970년대 말. 대학을 갓 졸업한 나는 모교에 국어교사로 부임했다.
교단에서 보니 교실은 동물원이었다. 순한 양도 있었지만 늑대, 기린, 사자도 보였다. 제자들도 내가 어떤 동물인지 간파했을 것이다. “침묵을 강요할 순 없다. 다만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련하리라.”
착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내를 시험할 심산인지 꾸준히 재잘대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다. 매를 들었다. 뺨 한 대 때리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효과도 있었다. “이건 사랑의 매야.”
현실은 영화와 닮아간다. 삐딱한 자세로 일관했던 아이에게 일격을 가했는데 그의 입에서 불량언어가 튀어나왔다. 이럴 때 밀리면 끝장이라는 건 상식. 난 거칠게 몰아쳤고 급기야 녀석은 가방을 들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수업은 엉망이 됐고.
문제는 종례시간에 터졌다. 반장이 담임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슬며시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은 아이는 교무실로 떠밀려 내려왔다. 담임은 내가 중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은사였다. 별명은 메뚜기였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 “무릎 꿇어.” 매질이 시작됐다. 사고가 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선생님의 몽둥이를 빼앗았다. 아이가 울면서 사과했다. “잘못…했….” 하지만 그 눈물의 성분은 반성이 아니라 반발이었음을 나는 안다.
며칠 후 수업에서 녀석은 나의 눈을 피했다. 똑바로 앉았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다. 학기말이 가까울 무렵 운동장 한쪽에서 내가 먼저 사과를 했다. “아직도 미워?”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나왔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말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눈길 한번 안 주셨잖아요.”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건넨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받는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개그콘서트’의 ‘선생 김봉투’라는 꼭지에 말썽만 부리는 아이(홍인규)가 고정으로 나온 적이 있다. 희한한 일을 도맡아 하다가 교사(김준호)가 야단을 치면 샐쭉한 표정으로 고백한다. “관심 받고 싶어요.” 맞다. 그 아이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다만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방법을 몰랐을 뿐.
심정적으론 지금도 나는 교사다. 선생님들껜 죄송하지만 교실, 아니 교육을 살리려면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도 달라진다. 왜 떠드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가 바로 일생에서 제일 떠들고 싶은 시기라는 것. 조용히 주목하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철든 아이거나 나처럼 겁 많은 아이일 개연성이 크다.
“교단 떠났다고 입 함부로 놀리는구나.” 전직 교사로서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다. 교실에서도 시청률을 올리자.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수업을 개발하자. 그러기 위해 사회는 교사에게 인내할 시간보다는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잡무라고 불리는 것들을 과감히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그 무렵이면 교실에서 ‘사랑의 매’도 종적을 감출 것이다.
교단에서 보니 교실은 동물원이었다. 순한 양도 있었지만 늑대, 기린, 사자도 보였다. 제자들도 내가 어떤 동물인지 간파했을 것이다. “침묵을 강요할 순 없다. 다만 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련하리라.”
착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내를 시험할 심산인지 꾸준히 재잘대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다. 매를 들었다. 뺨 한 대 때리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효과도 있었다. “이건 사랑의 매야.”
현실은 영화와 닮아간다. 삐딱한 자세로 일관했던 아이에게 일격을 가했는데 그의 입에서 불량언어가 튀어나왔다. 이럴 때 밀리면 끝장이라는 건 상식. 난 거칠게 몰아쳤고 급기야 녀석은 가방을 들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수업은 엉망이 됐고.
문제는 종례시간에 터졌다. 반장이 담임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슬며시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은 아이는 교무실로 떠밀려 내려왔다. 담임은 내가 중학교 때 수업을 들었던 은사였다. 별명은 메뚜기였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분. “무릎 꿇어.” 매질이 시작됐다. 사고가 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선생님의 몽둥이를 빼앗았다. 아이가 울면서 사과했다. “잘못…했….” 하지만 그 눈물의 성분은 반성이 아니라 반발이었음을 나는 안다.
며칠 후 수업에서 녀석은 나의 눈을 피했다. 똑바로 앉았지만 마음은 삐뚤어져 있었다. 학기말이 가까울 무렵 운동장 한쪽에서 내가 먼저 사과를 했다. “아직도 미워?” 손을 뿌리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나왔다.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말 아니었을까. “선생님은 눈길 한번 안 주셨잖아요.”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건넨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가 받는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개그콘서트’의 ‘선생 김봉투’라는 꼭지에 말썽만 부리는 아이(홍인규)가 고정으로 나온 적이 있다. 희한한 일을 도맡아 하다가 교사(김준호)가 야단을 치면 샐쭉한 표정으로 고백한다. “관심 받고 싶어요.” 맞다. 그 아이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다만 서로 관심을 주고받는 방법을 몰랐을 뿐.
심정적으론 지금도 나는 교사다. 선생님들껜 죄송하지만 교실, 아니 교육을 살리려면 먼저 교사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교사가 바뀌면 아이들도 달라진다. 왜 떠드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때가 바로 일생에서 제일 떠들고 싶은 시기라는 것. 조용히 주목하는 한 부류의 아이들은 일찍부터 철든 아이거나 나처럼 겁 많은 아이일 개연성이 크다.
“교단 떠났다고 입 함부로 놀리는구나.” 전직 교사로서 그래도 이 말만은 하고 싶다. 교실에서도 시청률을 올리자.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수업을 개발하자. 그러기 위해 사회는 교사에게 인내할 시간보다는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잡무라고 불리는 것들을 과감히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언제쯤일지 모르지만 그 무렵이면 교실에서 ‘사랑의 매’도 종적을 감출 것이다.
주철환 jTBC 콘텐트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