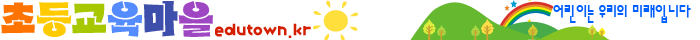컴퓨터&과학교육
단순 코딩 기술보다 ‘컴퓨팅 사고’가 중요한 시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가상 공간을 처음 창조하고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바로 컴퓨터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서핑하는 웹사이트, 그 뒤의 수많은 시스템을 모두 이들이 만들었다. 인터넷은 프로그래머의 손끝에서 시작된 세상이다.
프로그래머들이 만들고, 가꾼 인터넷 세상이건만 인터넷에는 프로그래머들을 놀리는 개그가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프로그래머 남편 이야기다. 어느 아내가 프로그래머 남편에게 “가게 가서 우유 하나 사와요. 아, 계란 있으면 6개 사오세요”라고 말했다.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왔는데 우유를 6개 사왔다. 아내가 “왜 우유를 6개나 사왔어요”라고 묻자 프로그래머 남편은 “계란이 있길래 6개 사왔지”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면 웃기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 쉽다.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조건문(IF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건문의 적용 범위를 혼동하면 에러가 생긴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사람과 달리 아내의 말을 “다른 조건이 없으면 우유 1개, 계란이 있는 조건이면 우유 6개”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방식에 빠진 남편이라 그런 프로그램처럼 작동했다는 것으로 프로그래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자학개그다.
사회성 떨어지고 눈치 없지만, 자기 일에 열심히 파고들며 사는 머리 좋은 사람. 우리말로 범생이라고 부를 만한 이런 사람을 너드(nerd)라고 하는데 프로그래머들이 딱 그런 모습이다. 똑똑한데 바보 취급받는 것이다. 비슷한 용어로 영어권에서 긱(geek), 도크(dork) 같은 단어도 있다고 하니 외국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양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존경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의학이나 법학 분야의 전공자에게 일반인이 내용을 따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디자이너에게 마치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색상과 폰트를 지적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는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무조건 재촉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풍토를 보여주는 인터넷 전설이 있다. ‘공밀레’라는 슬픈 전설인데 프로그래머 남편 이야기처럼 이것도 자학적이다. 신라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공양해 종소리에서 ‘에밀레… 에밀레…’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실제로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낸 이야기라고 함)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억지 요구를 하는 윗사람들 때문에 공돌이를 희생해 만든 제품에서는 ‘공밀레… 공밀레…’ 소리가 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이 떠오르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학교에서도 코딩을 가르친다고 하고, 발 빠른 사교육 시장도 프로그램 언어 수업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단순 기능공처럼 여기면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프로그래머는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관리 역할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그 모든 부담을 야근으로 채우는 일이 허다하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단순 코딩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문제의 해답을 일반화하는 능력, 즉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가 중요하다. 훌륭한 프로그래머들은 똑같은 일을 기계적으로 하는 숙련공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해결책을 찾아내고 구현해내는 전문가들이다.
오랫동안 세상의 공부 방법은 ‘정답 외우기’였다. 정답을 외워 시험 보고 그 시험 성적에 따라 사회에서 역할과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키보드만 두들기면 이미 있는 답들은 쉽게 검색된다. 문제는 답이 없는 것들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정답이 없는 수많은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 프로그래머가 대접받아야 하고 컴퓨팅 사고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임문영의 호모디지쿠스] 임문영 인터넷 저널리스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