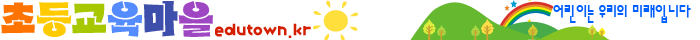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 지난 삼일절이었다. 독특하기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진작가 김중만씨가 나무 찍는 사진작업을 보여주겠다며 중랑천 뚝방길에서 만나자고 해 약속된 장소로 나갔다. ‘JTBC 정진홍의 휴먼파워’(매주 토 오전 8시) 삼월 둘째 주 녹화분을 찍기 위해서였다. 조금 늦게 도착한 김 작가는 나를 자신의 포르셰 자동차에 태우더니 ‘가람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왕복 2차로 뚝방 도로 위로 올라섰다. 그러곤 이내 ‘○○환경’이란 간판을 내건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줄지어 있는 길 한쪽에 차를 세웠다. 그나마 살수차가 지나가며 도로 위로 물을 뿌려댔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마른 먼지를 어쩔 도리가 없었다. 기대했던 봄기운 넘실대는 그런 중랑천 뚝방길이 전혀 아니었다.
# 눈에 안 띄려야 안 띌 수 없는 독특한 옷차림을 한 김 작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가에 드문드문 서 있는 앙상한 가지의 볼품 없는 나무들을 찍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에서 잠시 눈을 떼고 나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그의 눈은 번뜩거리며 그 나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러 해 전 서울 강북의 전농동에 사는 김 작가는 강남 청담동의 스튜디오로 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나다가 나무 하나에 눈이 꽂혔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나무에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단다. 물론 나무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과 영혼으로 소통하던 그 나무가 사진 찍기를 허락한 다음부터 그는 이곳에 와 그 나무를 찍었다. 처음에는 그 한 그루만 찍고 말 생각이었지만 결국 그 주변의 나무들과 잡풀마저 몽땅 찍게 되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4만 장을!
# 김 작가는 처음 “찍어도 되느냐?”고 말 걸었던 그 나무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다. 앙상한 그 나무는 거의 모든 가지가 생명의 흔적을 상실한 듯 보였다. 언젠가 ‘곤파스’라는 이름의 태풍이 휩쓸고 갔을 때 주변 나무들이 모두 쓰러질 때도 그 나무는 버티고 살아남았지만 새로 맞을 봄에는 다시 새순을 틔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김 작가는 그 나무를 한참 응시하다 마음먹었다는 듯이 어렵게 셔터를 눌렀다. 나 같은 범인의 눈에는 도저히 찍을 만한 것이라곤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무는 촌스러운 녹색의 쓰레기처리 컨테이너에 겹겹이 포위당한 채, 하늘로 제멋대로 솟은 가지들마저 볼썽사납게 뻗친 전신주와 그 사이에 이리저리 걸쳐진 전깃줄에 포박당한 모습이었다. 정작 사람이라면 단 한 시간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거기에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 있었다.
# 그런데 김 작가가 그 나무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자 어디선가 새가 날아들었다. 김 작가의 눈이 담긴 카메라 렌즈와 새의 깃듦, 그리고 은근한 햇살이 포개어진 그 나뭇가지에 잔잔한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다. 유독 거기만 살아있었다. 순간 김 작가가 4년 넘게 이곳에서의 촬영을 손 놓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 듯도 싶었다. 어쩌면 그 나무는 김중만의 카메라 렌즈를 통한 눈길만큼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집에서 키우는 나무도 눈길 주고 얘기 건네면 살아난다 하지 않던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 봄은 온다. 기어이 온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봄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봄은 생명이요 기운이다. 생명을 깨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눈길을 줘야 한다. 말을 걸어야 한다. 그 눈맞춤과 입맞춤이 너와 나 우리를 살게 한다. 삼월이라 봄은 온다지만 세상은 온통 선거다, 경선이다 하며 날만 서있다. 남남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도 눈맞춤 한 번 하고 말 한 번 제대로 걸기 힘든 세태다. 이럴 때일수록 소소하지만 따뜻한 눈길이 아쉽고 누군가 날 서지 않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리운 게다. 그 눈길에 죽던 사람도 살 수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
# 눈에 안 띄려야 안 띌 수 없는 독특한 옷차림을 한 김 작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가에 드문드문 서 있는 앙상한 가지의 볼품 없는 나무들을 찍기 시작했다. 카메라 렌즈에서 잠시 눈을 떼고 나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그의 눈은 번뜩거리며 그 나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여러 해 전 서울 강북의 전농동에 사는 김 작가는 강남 청담동의 스튜디오로 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나다가 나무 하나에 눈이 꽂혔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그 나무에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단다. 물론 나무는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과 영혼으로 소통하던 그 나무가 사진 찍기를 허락한 다음부터 그는 이곳에 와 그 나무를 찍었다. 처음에는 그 한 그루만 찍고 말 생각이었지만 결국 그 주변의 나무들과 잡풀마저 몽땅 찍게 되었다. 자그마치 4년 동안 4만 장을!
# 김 작가는 처음 “찍어도 되느냐?”고 말 걸었던 그 나무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다. 앙상한 그 나무는 거의 모든 가지가 생명의 흔적을 상실한 듯 보였다. 언젠가 ‘곤파스’라는 이름의 태풍이 휩쓸고 갔을 때 주변 나무들이 모두 쓰러질 때도 그 나무는 버티고 살아남았지만 새로 맞을 봄에는 다시 새순을 틔울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김 작가는 그 나무를 한참 응시하다 마음먹었다는 듯이 어렵게 셔터를 눌렀다. 나 같은 범인의 눈에는 도저히 찍을 만한 것이라곤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무는 촌스러운 녹색의 쓰레기처리 컨테이너에 겹겹이 포위당한 채, 하늘로 제멋대로 솟은 가지들마저 볼썽사납게 뻗친 전신주와 그 사이에 이리저리 걸쳐진 전깃줄에 포박당한 모습이었다. 정작 사람이라면 단 한 시간도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을 거기에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서 있었다.
# 그런데 김 작가가 그 나무를 향해 카메라 셔터를 누르자 어디선가 새가 날아들었다. 김 작가의 눈이 담긴 카메라 렌즈와 새의 깃듦, 그리고 은근한 햇살이 포개어진 그 나뭇가지에 잔잔한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다. 유독 거기만 살아있었다. 순간 김 작가가 4년 넘게 이곳에서의 촬영을 손 놓을 수 없었던 이유를 알 듯도 싶었다. 어쩌면 그 나무는 김중만의 카메라 렌즈를 통한 눈길만큼 살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집에서 키우는 나무도 눈길 주고 얘기 건네면 살아난다 하지 않던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 봄은 온다. 기어이 온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 봄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봄은 생명이요 기운이다. 생명을 깨우고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눈길을 줘야 한다. 말을 걸어야 한다. 그 눈맞춤과 입맞춤이 너와 나 우리를 살게 한다. 삼월이라 봄은 온다지만 세상은 온통 선거다, 경선이다 하며 날만 서있다. 남남은 말할 것도 없고 부부간에, 부모·자식 간에도 눈맞춤 한 번 하고 말 한 번 제대로 걸기 힘든 세태다. 이럴 때일수록 소소하지만 따뜻한 눈길이 아쉽고 누군가 날 서지 않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건네는 말 한마디가 그리운 게다. 그 눈길에 죽던 사람도 살 수 있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봄은 기어이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