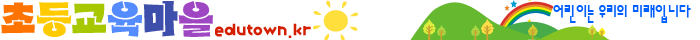좋은 글마당
평범한 선생님은 말을 하고, 좋은 선생님은 설명을 하며, 뛰어난 선생님은 몸소 보여주고, 위대한 선생님은 영감을 준다
[이훈범의 생각지도] 25m와 500m
물리적인 거리가 소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학자가 있다. 미국 MIT 경영대학원의 토머스 앨런 교수다. 그의 연구팀은 7개 연구소의 구성원 512명이 수개월 동안 조직 내 어떤 동료들과 상호작용했는지 조사했다. 결론은 싱거웠다. 두 사람의 소통 가능성은 그들의 물리적 거리와 강한 반비례 관계였다. 당연한 거였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대략 25m의 거리에서 소통의 가능성이 ‘0’에 근접한 것이다. 한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해도 고작 25m만 벗어나면 거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이 연구가 e메일 등장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고 그 의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도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몇 달 만에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경험이 흔치 않으니 말이다. 그렇게라도 한 번 만나면 문자를 열 번 주고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동료의 표정, 옷차림, 행동거지만으로도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직접 대면이라는 다채널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와 소통 간의 반비례 관계를 정면 부인하는 이도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의 거리가 25m의 스무 배인 500m나 되는데도 “대통령과 보좌진 간 소통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참모들이 면담 신청을 한 뒤 걸어서 10분 이상, 차를 타도 몇 분 걸리는 본관에 도착해 검문소를 통과하고 계단을 올라 2층 긴 복도를 지난 뒤 위압적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면 하려던 말도 다 까먹을 지경인데 말이다. 재배치 설계용역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겠다던 국회 운영위 여야 의원들만 머쓱해졌다.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청와대가 불통의 현장임을 인정하기 싫었을 터다. 하지만 국민들 근심은 어쩔 건가. 대등한 관계일 때 25m다. 상하관계일 때는 정서적 거리가 훨씬 멀다. 최고권력자와의 거리라면 수십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흔히 청와대의 개선 모델로 백악관을 들지만 백악관도 마찬가지다. 건물보다 사람이 더 문제다.
1986년부터 백악관을 출입한 유에스앤드월드리포트 기자 케네스 월시가 간파한 게 그거다. 그의 책 『백악관의 죄수들: 미국 대통령들의 고립과 리더십 위기』는 존슨, 카터, 닉슨, 아들 부시 같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갇혀 민심과 괴리되는 순간들을 짚어냈다. 특히 내성적이던 닉슨은 백악관에서 밥도 혼자 먹으며 실세 비서실장 밥 핼드먼의 입을 민심의 통로로 이용하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오바마 같은 사람은 백악관의 짧은 동선을 충분히 이용하는 대통령이다. 예고 없이 불쑥 기자실을 찾아 신임 대변인들을 소개하며 여론의 첨병들과 소통한다.
내가 볼 때 우리 대통령은 오바마보다는 닉슨에 가까운 성격이다. 아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까지 청와대 공간 재배치에 긍정적이었다가 그 고독한 군주적 위엄에 파묻혔듯 차기, 차차기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람이 같다면 건물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다. 간단한 문제다. 야당까지 협조하겠다는데 어려울 게 없다. 대통령만 마음먹으면 이 비서관의 생각 따위는 절로 바뀐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이기만 하며 심지어 멋있지도 않은 본관을 보다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로 바꿀 수 있다.
비서들은 다 본관으로 들어가 대통령과 매시간 부대끼며 국정을 논하고 미래를 토론해야 한다. 40년 넘어 무너질 위험인 위민관도 새로 지어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의 서울 출장소로 만들어도 좋겠다. 여전히 25m 한계에는 못 미치지만 KTX 속도로 대통령 곁에 달려왔지 않느냐 말이다.
이훈범 논설위원
이 연구가 e메일 등장 이전에 행해진 것이라고 그 의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에도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동료를 몇 달 만에야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경험이 흔치 않으니 말이다. 그렇게라도 한 번 만나면 문자를 열 번 주고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동료의 표정, 옷차림, 행동거지만으로도 그동안 벌어진 수많은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는 까닭이다. 직접 대면이라는 다채널 의사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물리적인 거리와 소통 간의 반비례 관계를 정면 부인하는 이도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이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근무하는 위민관의 거리가 25m의 스무 배인 500m나 되는데도 “대통령과 보좌진 간 소통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참모들이 면담 신청을 한 뒤 걸어서 10분 이상, 차를 타도 몇 분 걸리는 본관에 도착해 검문소를 통과하고 계단을 올라 2층 긴 복도를 지난 뒤 위압적인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서면 하려던 말도 다 까먹을 지경인데 말이다. 재배치 설계용역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주겠다던 국회 운영위 여야 의원들만 머쓱해졌다.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청와대가 불통의 현장임을 인정하기 싫었을 터다. 하지만 국민들 근심은 어쩔 건가. 대등한 관계일 때 25m다. 상하관계일 때는 정서적 거리가 훨씬 멀다. 최고권력자와의 거리라면 수십 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흔히 청와대의 개선 모델로 백악관을 들지만 백악관도 마찬가지다. 건물보다 사람이 더 문제다.
1986년부터 백악관을 출입한 유에스앤드월드리포트 기자 케네스 월시가 간파한 게 그거다. 그의 책 『백악관의 죄수들: 미국 대통령들의 고립과 리더십 위기』는 존슨, 카터, 닉슨, 아들 부시 같은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갇혀 민심과 괴리되는 순간들을 짚어냈다. 특히 내성적이던 닉슨은 백악관에서 밥도 혼자 먹으며 실세 비서실장 밥 핼드먼의 입을 민심의 통로로 이용하다 실패한 대통령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오바마 같은 사람은 백악관의 짧은 동선을 충분히 이용하는 대통령이다. 예고 없이 불쑥 기자실을 찾아 신임 대변인들을 소개하며 여론의 첨병들과 소통한다.
내가 볼 때 우리 대통령은 오바마보다는 닉슨에 가까운 성격이다. 아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까지 청와대 공간 재배치에 긍정적이었다가 그 고독한 군주적 위엄에 파묻혔듯 차기, 차차기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람이 같다면 건물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말이다. 간단한 문제다. 야당까지 협조하겠다는데 어려울 게 없다. 대통령만 마음먹으면 이 비서관의 생각 따위는 절로 바뀐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권위주의적이기만 하며 심지어 멋있지도 않은 본관을 보다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로 바꿀 수 있다.
비서들은 다 본관으로 들어가 대통령과 매시간 부대끼며 국정을 논하고 미래를 토론해야 한다. 40년 넘어 무너질 위험인 위민관도 새로 지어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의 서울 출장소로 만들어도 좋겠다. 여전히 25m 한계에는 못 미치지만 KTX 속도로 대통령 곁에 달려왔지 않느냐 말이다.
이훈범 논설위원
[출처: 중앙일보] [이훈범의 생각지도] 25m와 500m